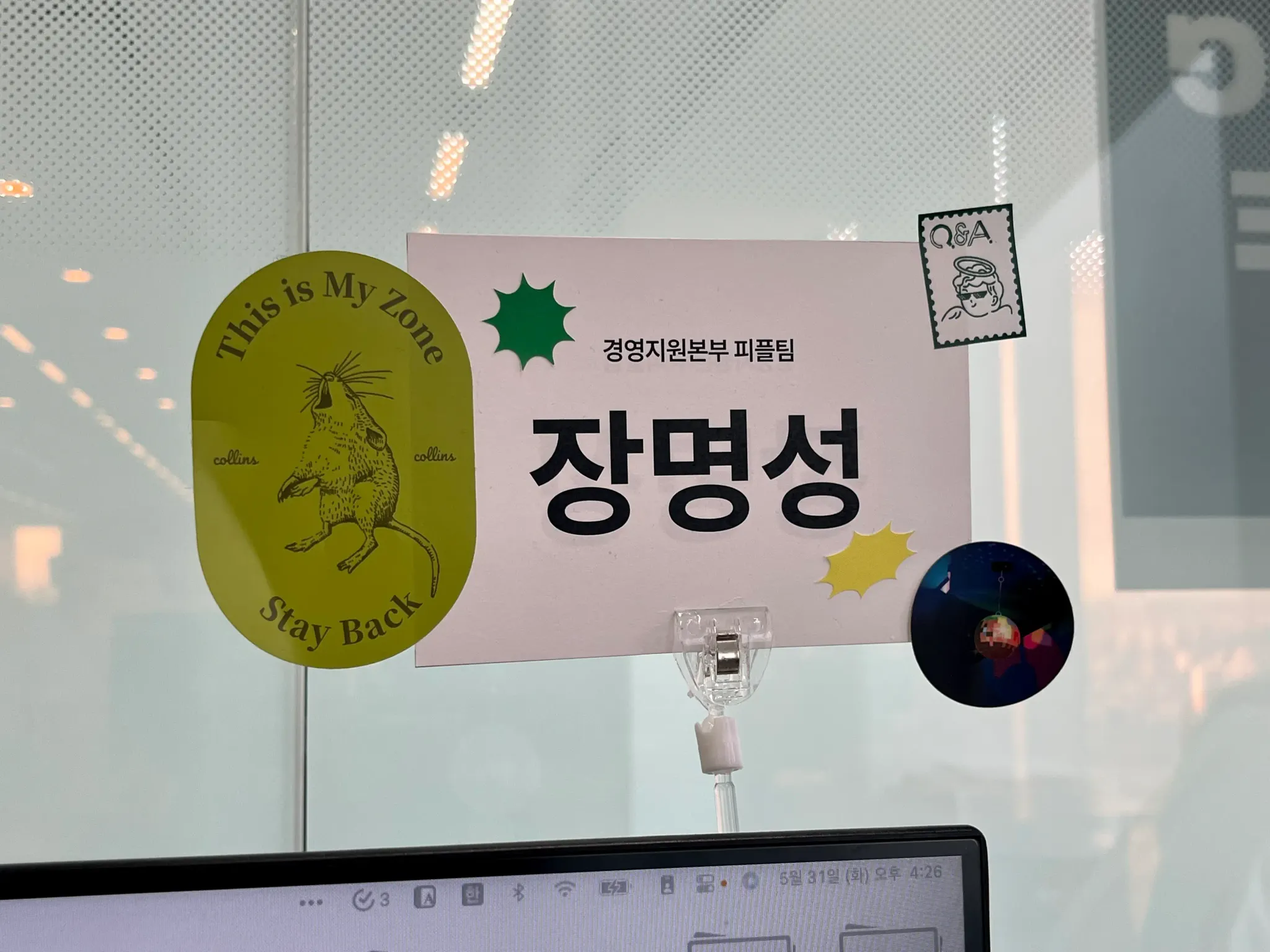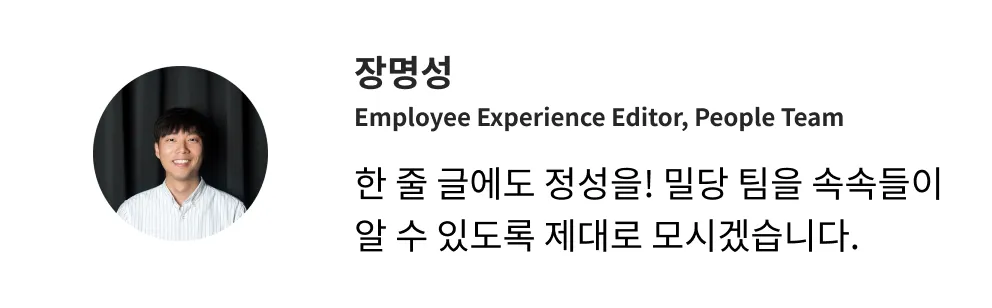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(IHFB) 여의도 오피스에 와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오피스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사로 잡는 요소 중 하나는, 높이 솟은 모니터 위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하얀 이름표들이라는 걸요. 트리플 모니터만큼 놀라운 비주얼은 아니지만, 멀리서도 잘 보이게 높이 달려 있는 이름표들은 그 귀여움만큼이나 업무 효율성을 높여 준 효자 상품(?)이랍니다. 별것 없어 보이는 이 이름표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와 맥락이 숨어 있을까요?
조직문화 담당자가 이름표 만들게 된 썰
지난 8월, 130명 남짓이던 회사에 합류해 가장 어려웠던 건 직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외우는 일이었습니다. 아무도 외우라고 강요하진 않았지만, 누가 누군지 잘 모르면 제가 만든 콘텐츠를 나눠 줄 때나 사내 메신저로는 하기 복잡한 이야길 전하려 할 때마다 사무실을 빙빙 돌아야 했으니까요.
지금은 더 넓고 쾌적한 오피스로 옮겨 왔지만, 그때만 해도 수용 인원을 훨씬 넘어선 사무실에 있었다 보니 자리를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. 한번은 앉은 자리로 팀원의 위치를 파악하다가 그 팀이 자리를 전체적으로 옮기는 바람에 사람 찾느라 몇 분을 허비한 적도 있었습니다. 그렇게 허비한 시간만 따지면 아마 글을 하나 더 썼을 텝니다.
팀원이 늘어갈 수록 답답한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. 팀원들을 계속 대면하며 답을 얻어내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제게는 더욱이 그럴 수밖에요. '방도를 찾아야겠다'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운 때쯤 한 팀원이 '이름표를 붙여 놓으면 안 되겠냐'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. 아, 왜 그 생각을 못 했던 걸까요?
이름과 얼굴, 그 사람의 자리를 몰라 집중해야 할 시간을 뺏기는 건 일하는 팀원에게도, 회사에게도 모두 손해인 것이 분명하지요. 어떻게 흘러 온 업무인지 모르겠지만, 이름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온 제가 업무의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. 서로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만드는 업무인 셈이니 조직문화 담당자가 맡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, 쉽고 빠른 합리화가 이뤄졌습니다.
어떻게 만들었냐고요? 사진에서 보이듯 멀리서도 이름이 뚜렷이 보일 수 있게 이런저런 디자인적 요소는 배제했습니다. 가까이 다가가면 소속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작게 새겨 넣었습니다. ‘이름 석 자(혹은 두~네 자)가 잘 보이도록’이라는 최우선의 목표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. 별거 아니어 보일진 몰라도 심혈을 기울인 작품입니다.
검은 모니터 위 하얀 이름표들입니다.
이름만 가리지 않는다면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합니다.
이름표랑 조직문화가 무슨 상관이길래
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피플팀(현 EX팀)은 팀원들이 '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' 가장 역점을 둡니다. 풀어 말해 보자면 '업무에 집중하고 더 나은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'인데요. 오해를 덜기 위해 덧붙이자면,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팀이 말하는 효율은 '직원을 몰아붙여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는'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. 업무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온보딩 시스템이나, 회사와 동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직문화 콘텐츠로 대표되는,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본질을 찾도록 돕고,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효율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. (자세한 맥락은 이 글에서 더 자세히 풀어 놓았으니 살펴 보셔요.)
이름표 제작도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겠죠. 이름표가 생기고 나서는 제가 만든 콘텐츠를 나눠줄 때나, 팅커벨에 제보해 준 팀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갈 때, 업무 중 궁금한 점을 물으러 갈 때 오피스를 빙빙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 제 작은 목표들을 수월히 달성할 수 있게 된 거지요. 더불어 잘 몰랐던 팀원의 이름을 조용히 되뇔 수 있게 된 것도 바람직한 일이고요.
이 손바닥만 한 종이에는 제 작은 욕심도 녹아 있습니다. 그 이름표가 서로를 한 번이라도 더 다정히 부를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연결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름 하나에는 하나의 세계가 담겨 있다고 하지요. 그런 탓에 이름표가 놓인 이후엔 팀원들 자릴 찾아갈 때마다 괜히 한 번 더 이름을 부르곤 합니다. 우리 일터에 “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다가와 꽃이 되는” 이상적인 상황만 펼쳐지진 않겠지만, 그럼에도 갓 시작한 인생에 보내는 응원을 응축한 세 글자를 따스히 부르는 일은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.